시정
IncheON : 이 아름다운,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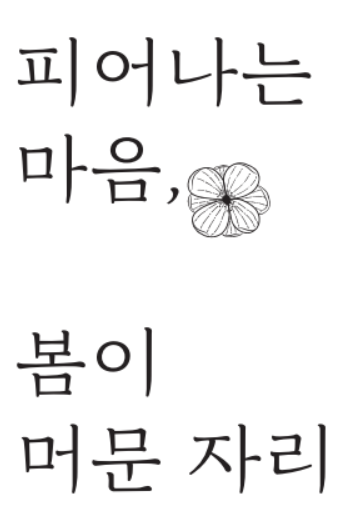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140번의 봄을 건너온 나무에 다시, 연초록 숨결이 피어난다.
이른 아침, 바람이 골목 어귀의 담벼락을 스치고 지나간다.
담장 너머 민들레 한 송이가 살며시 고개를 든다.
오래된 시장 골목, 닫혀 있던 셔터가 하나둘 올라가고,
창문이 열리는 집들 사이로 조심스레 발을 들이는 햇살 하나.
역 플랫폼에는 하루를 여는 발자국 소리가 차례로 이어지고,
시장 초입에선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봄보다 먼저 골목길을 지나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시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깨어난다.
굽은 어깨 위로 다사로운 햇살이 내려앉고
거친 손끝에 보드라운 바람의 숨결이 머문다.
누군가는 볼 빨간 아이의 목도리를 매만지고,
누군가는 멀어지는 마을버스를 따라 한참 눈길을 보낸다.
그 순간마다, 봄은 일상의 숨결 속에서 말없이 피어난다.
이 봄, 피는 건 꽃과 나무만이 아니다.
계절보다 먼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피어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주름진 이랑 사이로 노란 봄이 살랑인다. 어머니의 손길이 스친 자리마다, 봄빛이 번진다.

물오른 봄이 바구니마다 고인다. 갓 캐온 산나물로 장터에 초록이 물씬하다.

강화 장터, 들판의 봄을 고스란히 품었다. 풋풋한 초록 사이로 손끝의 계절이 피어난다.

꽃보다 곱디고운 할머니의 미소. 그 한순간, 봄이 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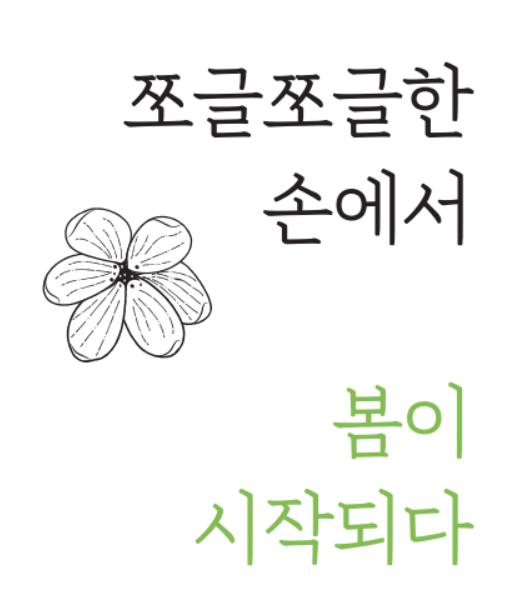
싱그러운 들판도, 햇살도, 바람도,
할머니 보따리에 포옥 담겨 장터로 마실을 나왔다.
빨간 고무다라이 안, 푸른 이파리들이 봄볕 아래서 소곤거린다.
강화읍에 장이 서던 날, 장터는 아직 반쯤 잠들어 있다.
“쪼글쪼글한 할머이 얼굴 찍어서 뭐 하시꺄.”
“아이고~ 벨나다 벨나. 새 시집가게 생겼시겨.”
웃음소리에 놀란 듯 여린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할머니 얼굴이 초록 들판처럼 환하다.
굽은 어깨 위로 나뭇잎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는다.
겨우내 얼어붙은 흙을 일군 것도,
텃밭에 씨앗을 심고 허리를 굽힌 것도, 어머니였다.
봄은 그렇게 다가와, 어느 순간 저만치 물러나 있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어찌 아나. 꼭, 한번 다시 와라.”
오글쪼글 주름지고 검버섯이 꽃처럼 핀 손.
그 손이 참 어여쁘고 따뜻하다.
그 위로, 봄 햇살이 살금살금 퍼진다.

한 줌의 바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봄이 반짝인다.

파고처럼 밀려온 세월을 건너, 오늘도 웃음으로 닻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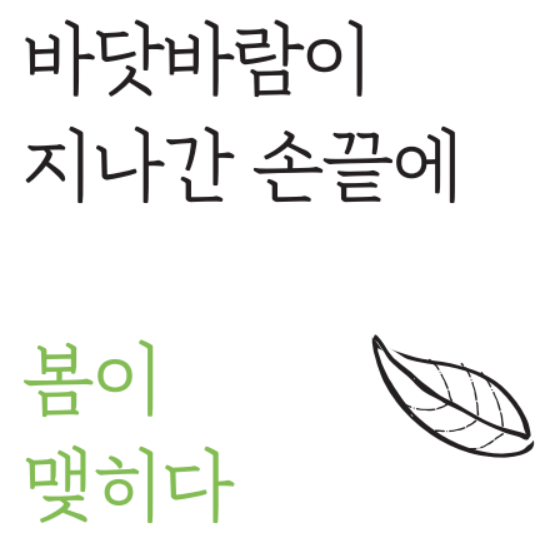
갯벌 위로 낮은 햇살이 잔물결처럼 번진다.
질척한 펄이 발목을 움켜쥐고,
차가운 바닷물이 손끝을 파고든다.
바구니 안 조개들이 사알사알, 젖은 몸을 부딪치며 속삭인다.
“물 들어오기 전에 얼른 캐야 해.
달 보고 물때 보는 건, 눈 감고도 해. 몸에 다 밴 거지.”
나이 든 어머니가 말없이 허리를 굽힌다.
평생 바다와 뒤엉켜 살아온 손은
갈라지고 터지다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 손이 건져 올리는 건,
하루를 견디는 바다 같은 희망이다.
“살만한가 했더니, 해 뜨고 바람 불면 가만있질 못해.
발이 먼저 바다로 간다니까.”
언젠가 뭍으로 떠난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갯벌이 잠잠해지는 사이, 조개를 하나 더 집어든다.
그 손끝에 내려앉은 봄빛 하나.
긴 세월 꾹꾹 눌러 삼킨 어머니의 눈물을 닮았다.

멈추지 않는 발걸음 사이로 봄이 소리 없이 다가온다.

도시의 하루를 묵묵히 세우는 손. 그 위로 가장 먼저 햇살이 머문다.

햇살을 품은 아이들. 그 반짝이는 웃음 속에, 봄이 먼저 도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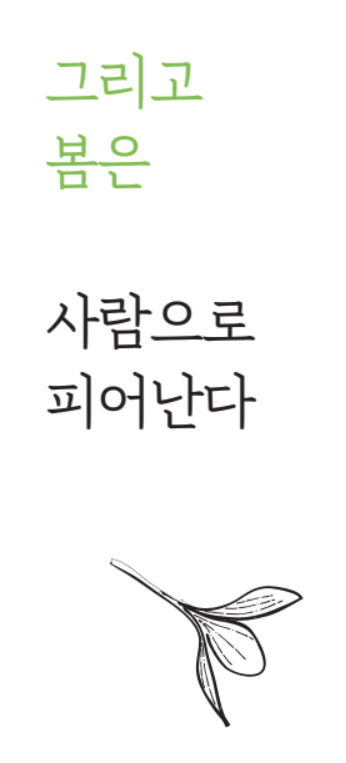
차가운 플랫폼 위로 이른 햇살이 아른거린다.
도시의 숨결은 아직 낮고 첫차는 멀리서 천천히 다가온다.
하루를 마중 나가는 사람들,
무거운 어깨, 식지 않은 커피를 쥔 손, 묵직한 발소리.
그저 스쳐 지나가는 눈빛들 사이에도 봄의 기척이 깃든다.
공사장 높은 발판 위, 한 노동자가 철근을 쌓아 올린다.
굳은살 박인 손등 위로 잠시 머무는 봄볕.
그 단단한 손이 오늘도 도시의 하루를 지탱하리라.
해가 기우는 골목 어귀,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 나온다.
“야, 여기 봐봐. 꽃이 피었어!”, “진짜? 어디?”
까르르, 햇살 같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찰랑인다.
아이들 발끝에 꽃잎이 흩어지고,
그 웃음 따라, 봄이 달려온다.
- 첨부파일
-

